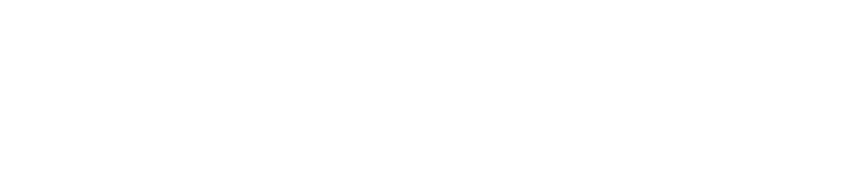의뢰인은 오랜 지인인 A씨로부터 “사업 운영에 급전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고 3,0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A씨는 해당 금원을 빠르게 상환하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하며, 확실한 담보가 있다는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의뢰인은 A씨의 말에 신뢰를 갖고 별다른 계약서 없이 돈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연락 또한 점차 두절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해당 채무가 단순한 변제불능이 아니라,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 기망에 의한 사기라 판단하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채무관계에 불과하고, 피의자가 돈을 갚을 의사는 있었다”는 이유로 불송치 처분을 내렸고,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을 찾아 고소를 지속하고자 하였습니다.

사건을 맡은 변호인은 불송치결정서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경찰이 기망 여부 및 변제 능력의 판단에 있어 피의자의 진술만을 신뢰한 채 피해자의 주장과 정황증거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을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피의자는 돈을 빌릴 당시부터 변제 계획이 전혀 없었으며, 수개월 전부터 채무불이행 상태로 다수의 채권자에게 빚을 지고 있었다는 점
2) 피의자가 말한 ‘담보’는 실체가 없는 것이었고, 이후에도 재산을 은닉하거나 타인 명의로 돌려놓은 정황이 있다는 점
3) 사건 직후 피의자가 연락을 피하고 도피성 행적을 보인 점
4) 실제 금융거래 내역, 문자 메시지, 제3자 진술 등을 통해 피의자의 ‘고의적 기망’이 충분히 드러난다는 점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이의신청서를 검찰에 제출하였고, 피해자의 입장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보충 의견서도 함께 전달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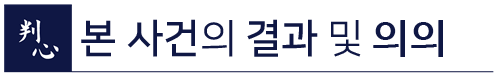
검찰은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기존의 불송치 결정을 취소하고, 피의자에 대해 사기 혐의로 공소제기(구공판)를 결정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이 주장해온 기망 사실이 정식 재판을 통해 다투어질 수 있는 단계에 이르게 되었으며, 단순 채무관계로 매도될 뻔했던 사건이 형사처벌 가능성이 열려 있는 사기 사건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기 피해자 신분으로 형사재판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향후 민사상 손해배상 및 강제집행에도 실질적인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사기 사건은 형식적으로 ‘돈을 빌려줬다’는 외관만으로 단순 채무관계로 오인되어 불기소 처분되는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거짓말로 돈을 받은 경우, 이는 명백한 형사상 ‘사기’에 해당합니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의 구체적인 정황과 자료를 토대로, 불송치 결정을 뒤집고 정식 재판으로 이어지게 만든 사례입니다. 단념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피해회복은 물론 가해자에게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는 처음 결과에 좌절하지 말고, 이의신청 등 후속 절차를 통해 반드시 끝까지 다퉈야 합니다.